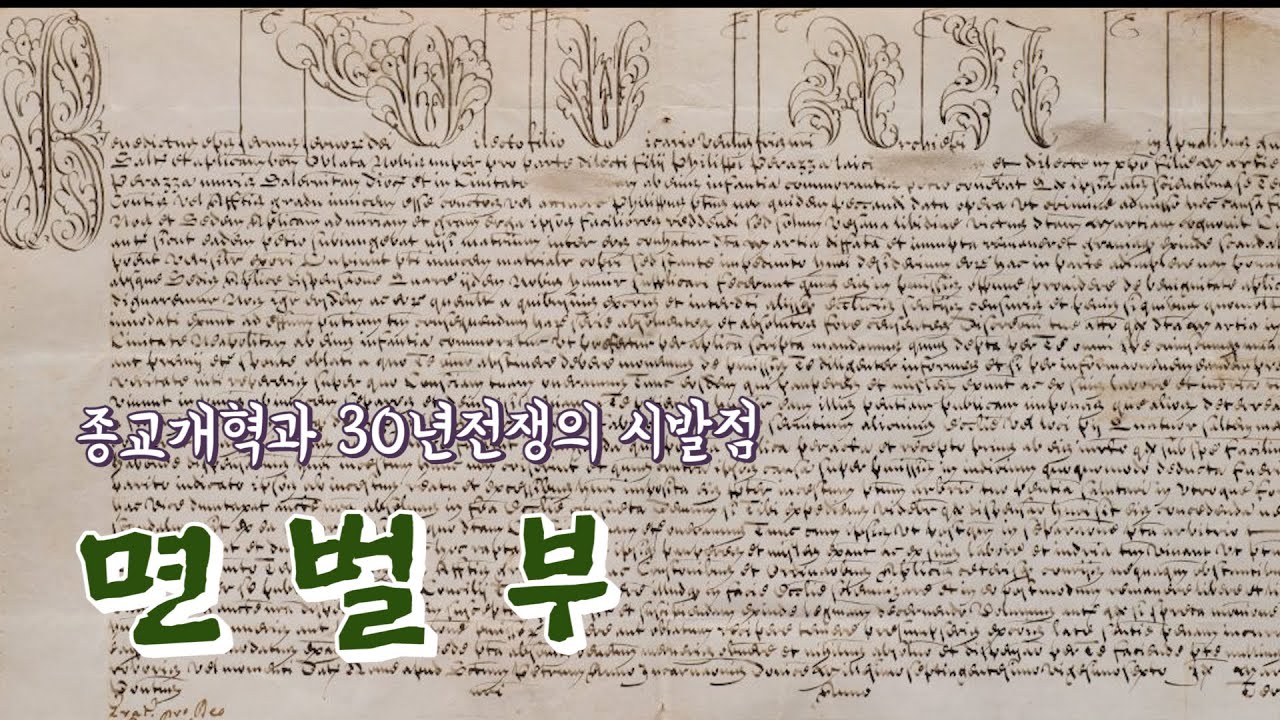
"면벌부"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 47쪽에 나오는 단어이다. '면죄부'가 아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운다고 한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2004년판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면죄부'만 나와 있다. 이번엔 교회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다.
"면벌부가 뭔지 알아?"
"......"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그래서 알뜰하게 설명해 줬다.
"면죄부란 건 말 그대로 죄를 면해 주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죄는 이미 지은 거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면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면벌부라고 해야 맞대."
그랬더니 그제야
"어, 그거 일리 있는 얘기네"
라고 한다. '면벌부'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바뀐 단어다. 2000~2004년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적용했다. 그 전에는 누구나 면죄부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들 썼다.
면죄부 또는 면벌부란 게 무엇인가? 바로 중세 말 루터의 종교 개혁 기폭제가 됐던, 돈 받고 교황청에서 팔던 그것이다. 영어로는 indulgence고 한자로 하면 免罪符 또는 免罰符다.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면벌부(면죄부 또는 대사부라고도 함)는 원래 십자군에 참전했거나 자선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교황이 발급한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짓고 받게 되는 벌을 일정한 속죄 행위를 통해 면제받은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남용되어 교황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로 되어 있다. 아직 면죄부를 병용하고는 있지만 정식 용어는 면벌부가 됐다.
면죄부로 써 오던 말을 면벌부로 과감히 바꾼 곳은 교육인적자원부다.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나온 편수자료를 통해서다. 편수자료란 초 중등학교에서 용어를 통일되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만드는 일종의 용어집이다. 물론 교과서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
카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고백성사를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일정한 요건을 거쳐 그 벌까지도 사해 주는 게 바로 면벌부란 얘기다. 카톨릭에서는 면벌부니 면죄부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사(大赦)'를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고 한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동안 써 오던 면죄부의 퇴장이며 동시에 면벌부의 새로운 등장이다.
면죄부는 종교 용어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일반 용어화한 말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래봐야 면죄부를 주는 것뿐이 더 되는가?"
식으로 이 말을 흔히 쓴다. 더구나 우리말에서 '죄'는 매우 폭넓은 의미로 쓰인다.
"못된 짓을 하더니 끝내 죄를 받았다."
라고 하는 데서 '벌'의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 그러면 죄 받는다."
란 말에서는 분명 죄와 벌이 구별되지 않는다. 사전에도 반영돼 있다. '면벌부'가 언젠가 뿌리를 내려 '면죄부'를 대체할지는 지금으로선 속단할 수 없다. 다만 한동안 면벌부와 면죄부가 뒤섞여 세대간 언어적 혼란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반 언중에게 생소한 말을 정부에서 나서 인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게 언어를 재단(裁斷)하는 행위란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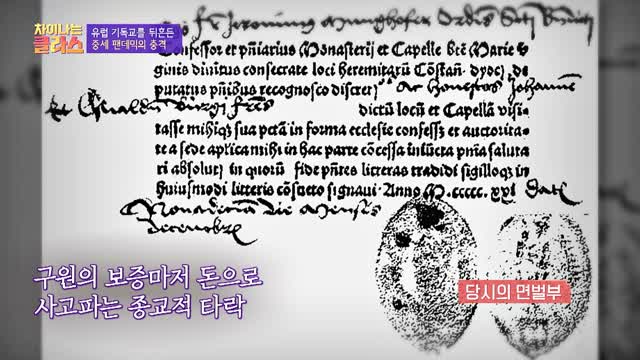
죄인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려 할 때 ‘면죄부를 주었다’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일반적인 용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학계에서는 ‘면죄부’를 ‘면벌부’로 대체하는 추세다. 왜냐하면 중세 신학에서 이 증서는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따르는 벌을 면해주는 효능을 갖기 때문이다. 죄인은 기도·단식·자선·순례 등의 ‘벌’로 속죄한다. 생전에 그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오랜 고통을 받아야 한다.
면벌부는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면서 역사라는 무대의 전면에 섰다. 십자군 전쟁이나 순례 여행 참여자들에게만 발부되던 면벌부가 루터의 시대에 이르면 약간의 현금을 지불한 자들에게 널리 발부되었다.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려는 교황청과, 자신의 관할 지역을 넓히려는 과정에서 빚을 진 독일의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자금이 필요했다. 그들은 면벌부 판매에서 재원을 발견했고, 요한 테첼이라는 독일 성직자에게 그 일을 맡겼다.테첼에겐 대중을 선동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 낳아 기르고 유산을 남겨준 부모와 친척을 몇 푼이면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아껴 연옥의 불꽃 고통을 받게 하느냐는 그의 말에 사람들은 지갑을 열었다. 그렇게 돈을 모았다.
“금고에 넣은 동전이 짤랑거리면,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
는 말도 그가 했다는 증거가 없지만 그의 말이 되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서 면벌부 판매를 지목하며
“금고에서 동전이 짤랑거리면, 탐욕만이 증가할 뿐”
이라고 힐난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테첼이 자신의 임무에 성공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그럼에도 그의 말년은 비참했다. 교황청에서는 그가 가톨릭 교리를 왜곡했다고 태형에 처했고, 대주교조차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민중의 폭력마저 두려워한 그는 수도원에서 생을 마쳤다.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도 하수인만 벌을 받을 뿐임은 이곳의 관료들도 알지 않을까? 그러나 면벌부가 암시하듯,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문, 파동, 파장> 쓰임새 (0) | 2023.10.09 |
|---|---|
| 상징어로서의 붉은악마 (2) | 2023.10.05 |
| 외국어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말 만들기 : 참살이 다걸기 (2) | 2023.10.04 |
| 386 : 동음이의어에 의한 칼랑부르(언어유희) (0) | 2023.10.04 |
| 현실을 반영하는 유행어 : 된장녀 (2) | 2023.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