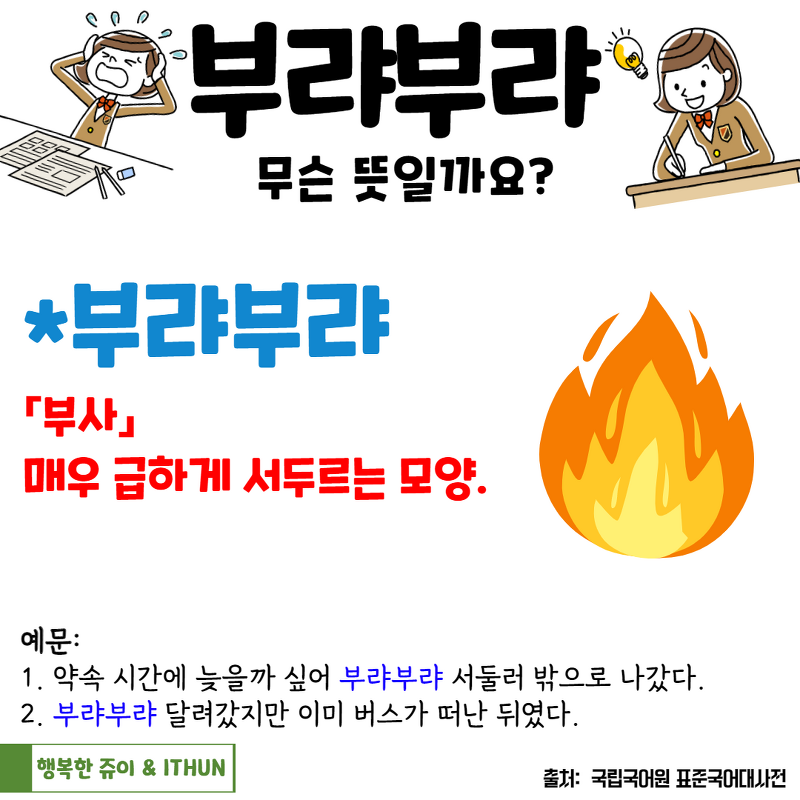
'수해'와 '화재'는 '악마(惡魔)'와 같이 무섭고 또한 두렵다. 그래서 '수해'는 '수마(水魔)', '화재'는 '화마(火魔)'라고 한다. 몇 해 전 충북 제천에서 무고한 시민 20여 명이 화마에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으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사후 청심환인 것을.
불이 나면 본능적으로 '불이야! 불이야!'를 외친다.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다. 아마도 이보다 다급한 외침은 없다.
"모다 소래 디라고 블이야 블이야 웨거날 모든 내인은 다 와 보대 (모두 소리 지르고 불이야 외치거늘 모든 내인은 다 와서 보되)" <서궁일기 1600년대>
에서 보듯 이러한 외침 소리가 17세기 문헌에도 나온다. 그런데 '불이야! 불이야!' 라는 외침은 '그는 불이야불이야 구두를 닥기 시작하얏다' (현진건 <지새는 안개 1923>)에서 보듯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서 내달리듯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지시하는 부사로 굳어진다. '불이야! 불이야!'라는 외침이 갖는 '급박성'이 매개가 되어 '황급히 서두르는 모양'을 지시하는 부사가 만들어진 것이다.
불사 '불이야불이야'가 줄어든 어형이 '불야불야'고, 이를 연철 표기한 형태가 '부랴부랴'가 된다. 20세기 전반기 문헌을 보면 이들 '불이야 불이야, 불야불야, 부랴부랴' 가 모두 함께 등장하는데, '불야불야'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부랴부랴'다. '불이야불이야'는 출현 빈도가 가장 낮다.
<조선어사전 1938>에도 '불야불야'가 표준어로 실려 있다. 그런데 <큰사전 1950> 이후 사전에는 '부랴부랴'로 올라 있다. '불[火]'과의 유연성(有緣性)이 상실되면서 연철 표기된 '부랴부랴'를 표준어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어사전 1938>에는 '불야불야'와 같은 의미의 단어로 '불야살야'도 함께 올라 있다. 1030년대에 나온 김유정의 소설에 '불야살야'가 다수 보인다. 이는 외침 소리인 '불이야!, 살이야!'에서 온 '불이야살이야'가 줄어든 어형이다. '불야살야'의 '불'은 물론 '화(火)'으 뜻이고, '살'은 '화살'을 가리킨다. 활터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접근을 막기 위해 소리치는 '활이야 살이야'의 '살'이 바로 그것이다. '살'을 동사 '살다'의 어간으로 보고, '불야살야'를 전체를 불이 났으니 살려달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단어 구조상 '살'을 동사 어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도 위험하고 '화살'도 위험하여 그것을 피하기 위해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불야살야'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 '불야살야'도 '부랴사랴'로 연철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부랴사랴'는 '부랴부랴'에 밀려 세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부랴부랴’는 일을 매우 급히 서두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부랴부랴 떠났다, 부랴부랴 달려갔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뒤에 나오는 동사인 ‘떠나다, 달려가다’의 행동을 급히 서둘러서 하는 모양을 표현할 때 쓰인다. 그래서 ‘부랴부랴’ 뒤에는 형용사가 오지 않는다. 동사만을 한정시키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랴부랴’는 ‘불 + -야’로 구성된 ‘불야’가 중첩된 첩어이다. ‘불야’의 ‘불’은 ‘산불, 등잔불’의 불[火]이고 ‘야’는 어미이다. ‘불야불야’는 ‘불이야불이야’에서 왔을 것이다. 불이 났을 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도 ‘불이야불이야’지만, 오늘날의 ‘부랴부랴’에 해당하는 부사도 ‘불이야불이야’였던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불이야’를 강조하기 위해 두 번 소리 지르는 것이 ‘불이야불이야’이다. 이처럼 어떤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소리 지르는 것으로는 ‘도적이야!’ ‘강도야!’ ‘도둑이야!’ 등이 있다. 그러나 ‘불이야’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옛날부터 ‘도적’이나 ‘강도’를 만나도 ‘도적이야’나 ‘강도야’라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오히려 나오지 않고,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나오는 현실 때문에, ‘불이야’는 꼭 불이 났을 때에만 쓰던 어휘가 아니라, 다른 일로 위급한 경우에도 사용하였던 어휘로 보인다.
결국 ‘불이야불이야 > 불야불야 > 부랴부랴’와 같은 변화를 겪어서 오늘날의 ‘부랴부랴’가 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불이 났을 때 외치는 소리는 ‘부랴부랴’로 적지 않고 ‘불이야불이야’로 적지만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서 내달리는 것처럼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말할 때에는 ‘불이야불이야’로 적지 않고 ‘부랴부랴’로 적는다. ‘불이야불이야’가 불이 났을 때 외치는 소리로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이고, 이 형태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 단어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다.
‘불이야불이야’가 다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미로 바뀐 것은 1920년대 초이었으며, ‘불야불야’가 오늘날의 ‘부랴부랴’의 뜻을 가지고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였다. 그리고 ‘부랴부랴’의 표기가 등장한 시기는 1930년대이었다. 그러니까 ‘불이야불이야’가 외치는 소리의 의미에서 급히 서두르는 모양의 의미로 바뀐 20세기 초에 ‘불야불야’로 음운변화도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1920년대 말까지는 ‘불이야불이야’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불야불야’도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불야불야’가 서두르는 모양의 의미로 고정되면서 그 표기도 ‘부랴부랴’로 변화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분화되면서 표기법까지도 바뀌어, 두 단어가 마치 서로 상관이 없는 단어인 양 변화한 셈이다.
그렇다면 왜 ‘불이야불이야’가 의미변화를 한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이야불이야’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이야’(불야)는 ‘불 + -이야’(불 + -야)로 분석된다. 이때의 ‘-이야’는 ‘이것은 무엇이야? 그것은 책이야’라고 말할 때 ‘책이야’의 ‘-이야’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단어가 동시에 나열되는 형태들의 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이다 ○○이다’의 구조나 ‘○○이다 ○○이야’의 구조를 사용한다.

“겨울 초입에서는 이른 추위가 닥쳐서 부랴부랴 김장들을 재촉하고…….” - 한수산, <부초>
“부랴사랴 외부대신 집으로 달려가는 교자가 있었다.” - 유주현, <대한제국>
‘부랴부랴’와 ‘부랴사랴’는 생김새가 아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두 낱말의 뜻풀이를 아주 같은 것으로 해 놓았다.
· 부랴부랴 :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
· 부랴사랴 : 매우 부산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 《표준국어대사전》
보다시피 그림씨 ‘부산하고’를 더 넣고 빼고 했을 뿐이니,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 도리가 없다. 외국인이라면 이런 뜻풀이 정도로 알고 그냥 써도 탓할 수 없겠지만, 우리 겨레라면 이들 두 낱말을 같은 것쯤으로 알고 써서는 안 된다. 선조들이 값진 삶으로 가꾸어 물려주신 이들 두 낱말은 저마다 지닌 뜻넓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랴부랴’는 느낌씨(감탄사) 낱말 ‘불이야!’가 겹쳐서 이루어진 어찌씨(부사) 낱말이다. “불이야! 불이야!” 하던 것이 줄어서 “불야! 불야!”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맞춤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해서 ‘부랴부랴’가 되었다. 이렇게 바뀐 것이 별것 아닌 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두 낱말이던 것이 한 낱말로 보태진 데다 느낌씨 낱말이 어찌씨 낱말로 바뀌었으므로 적잖이 커다란 탈바꿈을 한 셈이다.
본디 감탄사 ‘불이야! 불이야!’는 난데없이 불이 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부르짖는 소리다. 이것이 ‘불야! 불야!’로 바뀌는 것은 불난 사실이 너무도 다급해서 목으로 넘어오는 소리가 짧아진 까닭이다. 이런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불을 끄려고 시각을 다투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수라장을 이룬다. 어찌씨 ‘부랴부랴’는 바로 그런 아수라장에서 이리저리 뛰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낱말이다. 국어사전이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랴사랴’는 낱말의 짜임새로 볼 적에 ‘부랴부랴’와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뒤쪽 ‘부랴’가 ‘사랴’로 글자 하나만 바뀐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부랴부랴’와 마찬가지로 ‘부랴사랴’도 “불이야! 살이야!” 하던 것이 줄어서 “불야! 살야!” 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맞춤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해서 ‘부랴사랴’가 되기는 했다.
그러나 ‘부랴사랴’의 ‘부랴’는 ‘부랴부랴’의 ‘부랴’와 같지 않음을 짝으로 따라오는 ‘사랴’로써 알 수 있다. ‘사랴’는 ‘살야!’ 곧 ‘살이야!’인데, 이때 ‘살’은 다름 아닌 ‘화살’이다. 그러니까 ‘살이야!’는 “화살이야!” 하는 소리, 곧 날아오는 화살을 보고 놀라서 부르짖는 소리다. 그렇다면 ‘살’과 짝이 되어 날아올 수 있는 ‘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총알’이니 ‘탄알’이니 하는 그것이다.
“불 맞은 멧돼지처럼”,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하는 말은 오늘날에도 쓴다. ‘부랴사랴’는 총알과 화살이 날아오는 싸움터에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소리에서 비롯하여, “매우 부산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 굳어진 것이라 하겠다.
'우리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설거지의 어원자료 : 수습하고 정리하는 일 (2) | 2023.09.11 |
|---|---|
| 삿대질의 어원자료 : 삿대를 저어 배를 밀고 나가듯 (0) | 2023.09.11 |
| 말썽의 어원자료 : 말에도 모양새가 있다 (0) | 2023.09.11 |
| 뗑깡의 어원자료 : 간질을 뜻하는 일본어의 잔재 (0) | 2023.09.11 |
| 노가리의 어원자료 : 명태는 한꺼번에 수많은 알을 깐다 (0) | 2023.09.11 |



